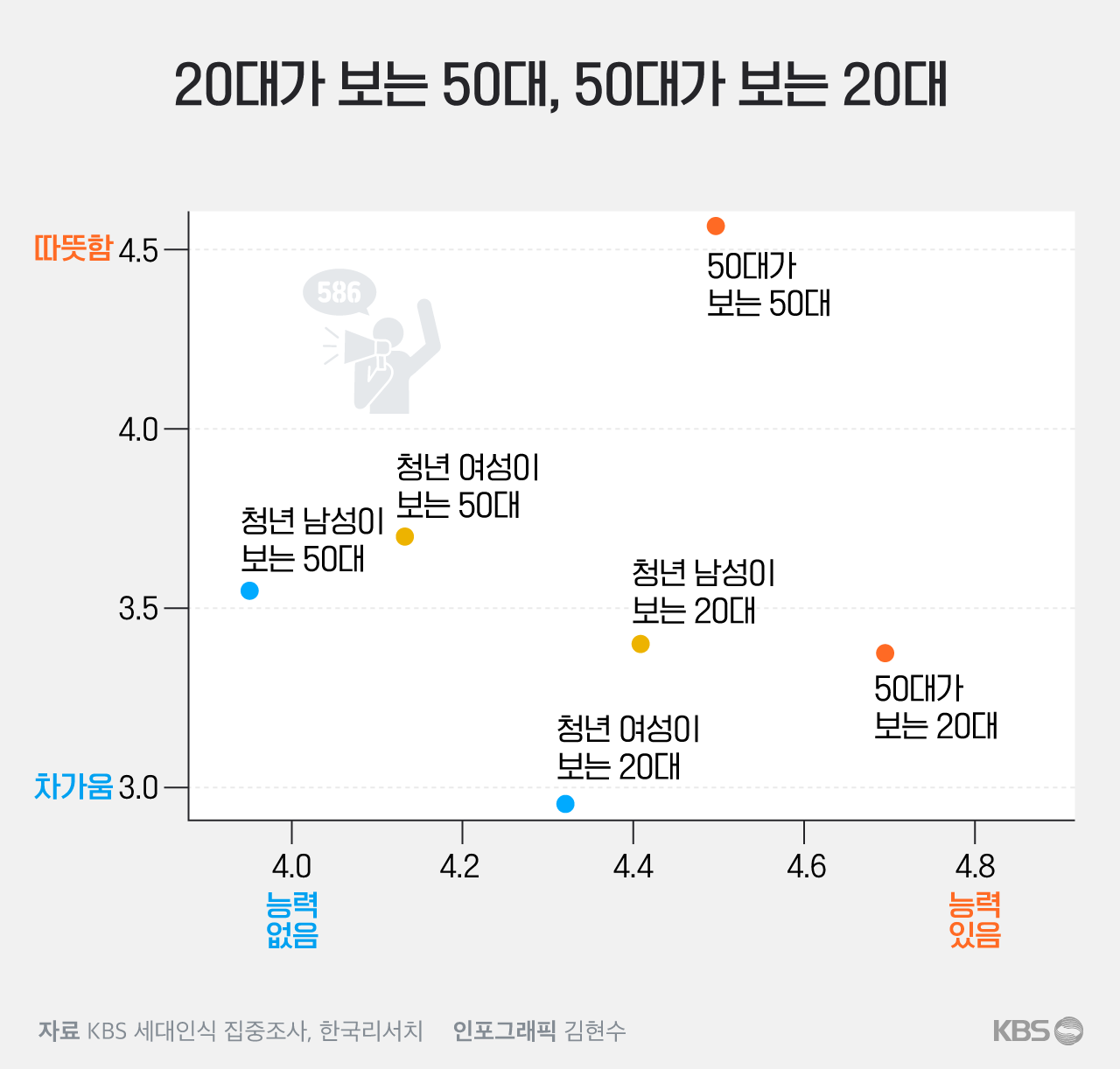"요즘 젊은 것들은 개인주의적이어서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해." 이 흔한 문장에서 우선 몇 가지를 바로잡자. 첫째, 문제를 주의(主義)로써 설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관 싸움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으니, 그보다는 행동이나 태도의 문제로 대신 설명하기로 하자. 둘째, 젊은 직원들이 연로한 직원보다 회사에 덜 협동한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없는 이상, '어떤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회사를 위한 자발적인 협동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고 대신 설명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다: 집단을 위해 자발적 협동을 보이지 않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집단 속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은, 어느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눈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회사생활로 그 무대를 옮긴다면 아마도 (수당을 보장할 수 없는) 강행군 같은 야근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이론이 집단 관여 모형(group engagement model)이다(Tyler & Blader, 2003). 그리고 집단 관여 모형은 직원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 즉 급여의 합당한 배분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심리적인 차원, 즉 자신을 향한 동료들의 경의와 상급자의 존중 어린 눈빛에 만족할 때에야 비로소 집단에 대한 헌신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놀랍게도 회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심리라는 개인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작동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회사에 대해서 '돈 벌어 보자고 모인 곳', '이해관계가 맞아서 모인 사람들' 같은 표현들을 쓰지만, 집단 관여 모형을 위시한 정의 이론(justice theory)에 따르면 이런 공적이기만 한 집단은 안정적이기 힘들다(see Tyler & Blader, 2000). 어느 순간부터는 '자부심 느껴지는 우리 회사', '내가 빛나는 이곳', '나를 높여주는 동료들' 같은 사적인 생각들까지 등장해서 그 집단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직원들은 눈 앞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굳이 시키지 않은 헌신까지도 먼저 드러내기 시작한다(Blader & Tyler, 2009; see also Huo, Binning, & Molina, 2010).
따라서 경영자들은 직원들을 계산기 두드리는 경제인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해야 한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을 존엄과 경의로 대할 때 비로소 직원들도 진심을 다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자발적으로 야근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른 학문분야들은 수당 없는 야근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해 왔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세라는 것은 번창하다 기울다를 반복하며, 때로는 모두가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야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면, 적어도 사회심리학자들에게서 해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Blader, S. L., & Tyler, T. R. (2009). Testing and extending the group engagement model: Linkages between social identity, procedural justice, economic outcomes, and extrarol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2), 445-464.
Huo, Y. J., Binning, K. R., & Molina, L. E. (2010).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respect: Implications for social engagement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2), 200-212.
Tyler, T. R., & Blader, S. L. (2000). Cooperation in groups: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behavioral engagement. Routledge.
Tyler, T. R., & Blader, S. L. (2003). The group engagement model: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coopera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349-361.
'Social Psychology >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디어】 20대 "고학력" 남자 현상: 장기적 목표추구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0) | 2021.09.27 |
|---|---|
| 【코멘터리】 일베는 극단주의 집단일까? 인식의 틀을 바꾸면 피해자가 보인다 (2) | 2021.09.17 |
| 【코멘터리】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 그 전에, 그 후에 넘어야 할 한일관계의 과제들 (6) | 2021.09.12 |
| 【코멘터리】 사회과학도가 어디에 말을 얹고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0) | 2021.09.08 |
| 【코멘터리】 코로나19 시국 속 종교가 제공하는 사회심리적 기능 (0) | 2021.08.25 |